세계적 경영 학술지에 실린 연구성과 가운데 실무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지식을 소개합니다
Behavioral Economics
기부하면
더 건강해진다?
Based on “Does Giving to Charity Lead to Better Health? Evidence from Tax Subsidies for Charitable Giving” by , B. K. Yoruk (2014,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무엇을 왜 연구했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투자에 대한 열정 못지않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욕구는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건강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다. 다이어트를 하든, 심장에 특효라는 건강식품을 구입하든, 고장 난 심장을 대체할 복제심장이나 인공심장을 찾아 헤매든 궁극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이기적 행동이다. 우리는 창조와 혁신의 시대에 산다. 역발상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세상이다. 아마존이나 애플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무적 관점에서 역발상 중 하나는 남을 위해 내가 가진 재산을 쓰는 이타적 행위가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부른다. 과연 기부행위가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발견했나?
기부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나눔이다. 이기적 행위나 이윤 추구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시장경제하에서 복지실현과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의 정책도 이를 독려한다. 미국에서는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100%를 소득공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는 미국처럼 소득공제를 허용했었는데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세액공제(기부금의 15%, 특별한 경우 25%)로 바뀌었다. 정부의 기부 장려 조세정책이 기부비용을 줄이고 기부액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는 건 당연한 결과다.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 긍정적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기부를 생각만 해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찾아내 무력화시키는 단백질이 증가한다거나 기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해 기대수명을 증가시킨다든가, 자원봉사(노동 또는 재능기부)가 불안과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이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기부를 하면 기쁨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Ventral Striatum)가 활성화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연구결과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자선연구센터(COPPS)에서 제공하는 4년치(2001, 2003, 2005, 2007)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기부와 건강의 상호관계를 살펴봤다. 패널데이터는 설문대상인 각 가정의 가장이 내는 연 기부금액은 물론 건강 인덱스(index), 다양한 경제, 사회, 교육, 개인 변인들(가계수입, 결혼, 이혼, 주택소유, 교육수준, 나이, 인종)을 함께 제공한다. 건강 인덱스는 자신의 건강척도를 5단계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최하위 수준인 ‘좋지 않다(Poor)’에서부터 최상위 수준인 ‘최상이다(Excellent)’로 표시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표본에 속한 가정의 69%가 기부에 참여했다. 평균 기부액은 1527달러(약 170만 원)였다. 기부금 세금감면혜택의 정도에 따라 표본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건강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세금감면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평균 기부액이 가장 큰 그룹)에 속한 가정의 0.8%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세금감면혜택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는 4.9%의 가정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 전자의 경우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의 비율이 36.6%에 달했지만 후자는 20.5%에 그쳤다. 회귀분석결과 남녀, 인종, 결혼 유무를 불문하고 기부액의 증가는 고혈압, 폐질환, 관절염, 당뇨, 암, 심장질환, 정서적·심리적 장애,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연구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건강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건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며 교육열과 저축률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의 사적 관심거리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셈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이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또다시 더 큰 기부로 귀결되는 상생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화두가 된 공유경제, 나눔경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경제에서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 플러스(유+) 또는 유의 제곱(유2)을 만드는 게 아닐까. 기부하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행복은 덤이다.
곽승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mail protected]
필자는 연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와 텍사스공과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경영통계학 석사, 테네시대(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에서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타주립대 재무관리 교수로 11년간 재직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행동재무학/경제학, 기업가치평가, 투자, 금융시장과 규제 등이다.
Psychology
“많이 배웠다”는 느낌
실제보다 ‘강렬한 감정’이 더 큰 영향
Illusions of Learning: Irrelevant Emotions Inflate Judgments of Learning by Boy Baumeister, Jessica Alquist, & Kathleen Vohs (2015).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8, 149-158.
무엇을 왜 연구했나?
감정은 동기작용이자 인지작용이다. 감정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동력이 생기도록 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 및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과정에도 감정은 배우려고 하는 동기를 일으키는 일과 함께 배움의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작용을 한다. “많을 것을 배웠다”라고 할 때, 실제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에서 느낀 감정의 강도에 의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판단한다. 감정이 동기작용이기에 감정의 강도는 자신의 학습량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경험은 늘 학습에 들인 노력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배운 게 없어도 감정경험이 강렬하면 많이 배웠다고 착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친 후 교육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많이 배웠냐고 질문하면 “많이 배웠다”고 답한다. 그러나 그 교육 이후 교육생들의 시험 성적은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애인과의 이별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배운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면 그 내용은 공허하거나 사소한 게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강의나 이별의 고통을 통해 겪는 감정경험은 강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운 내용이 없어도 많이 배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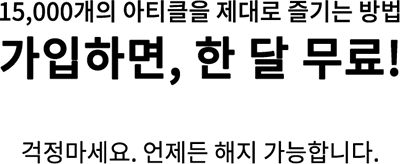
회원 가입만 해도, DBR 월정액 서비스 첫 달 무료!
15,000여 건의 DBR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