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강 상무를 구하라
편집자주
현직 중간관리자 혹은 임원으로서 궁금한 점이나 다뤄보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며칠째 지루한 회의만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로 이직한 지도 벌써 한 달을 넘어 두 달을 향해 가면서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해 지기 시작했다.
회사 분위기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 상황. 미래생명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압박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잘 돼가나?”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대표의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선다. 구성원들을 한데 모아 신제품 구체화 회의에 들어간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해결책이 웬 말인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장 조사와 향후 트렌드 분석을 그토록 치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 계획은커녕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박 수석연구원에게서 나타났다.
이직 첫날부터 마치 본인이 회사의 터줏대감인 것 마냥 텃새를 부리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의견이라면 무조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퍼스널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누구나 쉽게 휴대하면서 신체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방 안의 필수품으로 말이죠.”
“거참 말 쉽게 하시네….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고는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알고나 왔냐고요. 본부장이 이야기한 건 이미 출시된 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판매 부진으로 1년 만에 단종된…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없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제품이란 말입니다.”
“!!!!”
“(훗! 모르는가 보군) 회사 히스토리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오시죠? (최 연구원에게 귓속말로) 우리 회사는 직책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냐? 아무한테나 말이야.”
최 연구원에게 하는 귓속말이 왜 나한테도 선명하게 들리는 거지? 들으라는 건가? 해보자는 건가?
“… 혹시, MTT-260P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제품이라면 저도 잘 알죠. 물론 출시 당시에는 그런 제품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만 어렵게 구해서 실제 사용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 수석이 제품 기획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시된 해가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웠을 때죠.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했던 시기에는 사치품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가격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었고요. 개인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이라는 말이 더 맞죠. 크기도 너무 컸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시장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요?”
“K바이오에 오기로 한 이상 어떻게 회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올 수 있나요? 특히, 어떤 제품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분석하고 왔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 상황도, 기술 수준도 그때와는 다르니까요. 박 수석이 아닌 제가 본부장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판단 능력의 차이 때문 아닐까요?”
‘OK! 이번엔 내가 이겼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뭘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박 수석연구원에게 빼앗기는 것만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박 수석연구원과의 한바탕 설전으로 인해 냉각된 회의 분위기를 깨트린 이는 기획파트의 전 과장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은데요. 다들 야근할 각오하고 오늘은 결론이 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전 과장의 발언에 발끈한 이가 등장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또다시 급랭됐으니… 같은 기획파트의 이 대리다.
“전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 취소해.”
“과장님! 그렇게 느닷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이 마당에 놀러간다고? 다들 일하는 거 안보여? 넌 회사는 안중에도 없어? 엉?”
“놀러 간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고요. 회사일, 출근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개인 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죠. 아니면 미리 말씀해 주시던가요.”
“이런 게 바로 회사란 거 몰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제대로 된 안건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에서 예고도 없이 터지는 폭탄들. 여기에 박 수석연구원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다.
“자자, 이러다가 싸움 나겠어. 오늘은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풀어보자고.”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미래생명사업본부. 도대체 회의는 언제 하냐고!
‘으… 이러다 병나겠네, 병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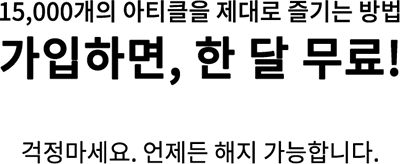
회원 가입만 해도, DBR 월정액 서비스 첫 달 무료!
15,000여 건의 DBR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세요.